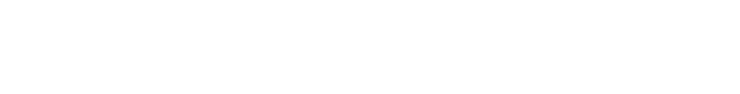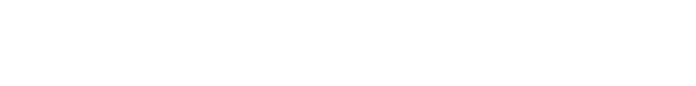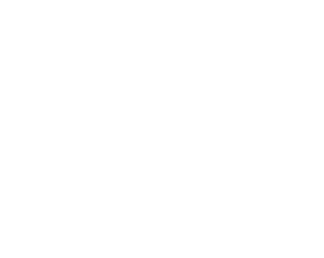아트선재센터 개인전 ‘상실의 서른 여섯 달’
인도네시아계 브라질 작가 댄 리(36)는 흙이나 꽃, 버섯종자 같은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작업을 한다. 시드는 꽃이나 버섯이 자라는 종자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그의 작품도 수개월 전시 기간 중 계속 조금씩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작가는 재료의 변화를 보며 자신이 ‘비인간적인 주체’와 작업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발효는 작가에게 삶과 죽음,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16일 시작하는 댄 리의 한국 첫 개인전 ‘상실의 서른 여섯 달’ 역시 변화하는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작품들로 채워진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 전통문화, 특히 삼년상에서 영감을 얻은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며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짚풀공예 장인,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 등을 만나 발효와 도예, 죽음과 전통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작가는 특히 삼년상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올해가 작가의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해라는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지면서 그는 재료의 발효와 부패, 소멸 과정을 통해 애도를 끝마치는 여정으로 이번 전시를 구성했다.

울금으로 노랗게 염색한 직물들이 전시장을 둘러싼 가운데 곳곳에 놓인 흙더미에서는 새싹과 버섯 종자가 심어졌고 장례에 쓰이는 국화와 삼베, 면포로 만든 구조물이 천장에 매달렸다. 군데군데 놓인 옹기에는 쌀과 누룩이 들어있다.
그의 다른 작업처럼 이번 전시에서 사용된 소재들도 모두 변화하는 것이다. 국화는 전시 기간 교체되지 않고 서서히 시들어 가고, 새싹과 버섯포자에선 싹이 날 수도 있다. 노랗게 염색한 직물은 전시 기간 햇볕을 받아 탈색되고 옹기 속 쌀과 누룩은 발효돼 막걸리가 되어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업은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유일한 작업”이다.
전시 개막에 앞서 14일 만난 작가는 “삼베 수의를 태우는 과정을 통해 애도가 종결된다고 한다”면서 “다양한 물질의 변화를 이용해 작업해 온 나로서는 불을 쓰지 않고 내 방식으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죽음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특히 이번 작업 과정에서 (애도를) 종결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변화하는 전시 작품들은 5월12일까지 볼 수 있다. 3월7일까지 무료로 볼 수 있고 이후는 유료 관람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